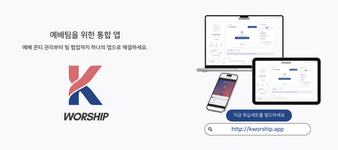BBC : '한-중 김치 논쟁, 문화적 불화'
- 라이프 / 김혜성 / 2020-12-01 12:38:31
 |
| ▲ 중국 민족주의 성향의 관영 환구시보는 이를 “중국이 주도하는 김치산업의 국제표준(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kimchi industry led by China)”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영국 BBC방송 홈페이지 해당 기사 일부 캡처.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한국인들의 성스러운 음식인 ‘김치(Kimchi)’ 생산으로 세계 인증을 받은 한국은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전면 거절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지난 주 세계 산업표준기구 ISO는 중국 소금에 절인 발효 채소의 일종인 파오차이(pao cai) 제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일부 중국 언론은 김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한국 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웃 국가들 사이의 가장 최근의 문화적 분쟁이라고 BBC는 전했다.
김치는 보통 배추로 만드는 매운 피클 요리다. 김치는 종종 중국에서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지만, 중국에는 파오차이라고도 부르는 고유의 변종이 있다.
이달 초 ISO는 파오차이의 개발,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의 대다수가 생산되는 쓰촨성 당국은 이 인증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ISO 목록에는 분명히 “이 문서는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kimchi)”고 나와 있지만, 일부 중국 언론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 민족주의 성향의 관영 환구시보는 이를 “중국이 주도하는 김치산업의 국제표준(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kimchi industry led by China)”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언론 보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는 소셜 미디어(SNS)에서도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 후 한국의 농림부는 2001년에 국제 김치의 표준이 유엔에 의해 합의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 쓰촨(四川)성 파오차이(pao cai)와 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중국 언론의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한국 농림부가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전통적으로 김치는 양념과 발효된 해산물을 넣기 전에 야채를 씻고 소금에 절여 지하에 숨 쉴 수 있는 점토 항아리에 제품을 넣어 만든다. 김장(Kimjang)이라고 알려진, 매년 그것을 만드는 의식은 UN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되었다고 BBC는 소개했다.
한국의 높은 수요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생산자들로부터 많은 양의 김치를 수입한다. 한편 한국의 김치 수출은 중국의 엄격한 절임용품 규제로 사실상 전무하다.
김치 요리는 최근 몇 년간 외교 충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2001년 김치의 조리법을 국제적으로 성문화(codification)한 것은 피클을 좋아하는 이웃인 일본과의 분쟁 이후였다.
올해 중국과 한국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최근의 일이 김치 분쟁(?)이다.
온라인 토론은 몇 주 전 중국 시대 드라마(period drama) 왕실의 잔치에 사용된 의상에 대해 촉발되었다. 논란은 중국 배우 쉬카이(许凯 , Xu Kai)가 SNS 웨이보에 촬영 중 의상을 입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상이 한복으로 알려진 한국의 전통 의상을 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쇼의 제작자 유젱(于正, Yu Zheng)은 이것이 한푸(hanfu)로 알려진 봉건적인 중국 의복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올해 초 K-Pop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중국 언론에서 멤버 중 한 명이 한국전쟁과 관련 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상식에서 RM으로 알려진 김남준은 갈등의 비극과 한미가 공유하는 '고통의 역사'에 대해 한 이 발언은 전쟁 중에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부 중국인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